윤동주 시인님의 시 '쉽게 씌어진 시'를 만납니다. 윤동주 시인님의 마지막 시입니다. 함께 읽으며 마음을 맑히는 독서목욕을 하십시다.
1. 윤동주 시 '쉽게 씌어진 시' 읽기
쉽게 씌어진 시(詩)
- 윤동주(1917~1945, 북간도 명동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려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윤동주 시집 - 그의 시와 인생」(권일송 편저, 청목문화사, 1987년) 중에서
2.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님의 '쉽게 씌어진 시'는 시인님의 마지막 시입니다. 1942년 6월 3일에 쓰인 시인데, 그때는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릿교(立敎)대학에 유학 중이던 때입니다.
그해 4월 2일에 릿교대학에 입학했으니 입학 두 달 후에 이 시를 썼네요. 머나먼 타국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윤동주 시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6월, 여름비가 내리는 밤입니다. '육첩방'은 다다미 여섯 장을 깐 일본방입니다. 3평 정도 되는 공간이네요.
비 오는 밤, '남의 나라' 좁은 방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자조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가 암담한 현실 상황을 어쩌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꼈을까요?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며 진실을 말하는 시인의 '천명(天命)'을 다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걸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어
대학 노-트를 끼고 /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려 간다
- 윤동주 시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고향 명동촌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눈물이 묻은 돈입니다. 그 속에 '땀내와 사랑내'가 스며 있다고 하네요. '사랑내'라는 표현이 멋지네요. 넉넉한 형편이 아닌 부모님이 보내준 거금, 그 속에 든, '나'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네요.
이 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한 시인님은 이때 '영어학연습'과 '동양철학사' 등을 수강했습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 어쩐지 캐캐묵은 냄새가 날 것만 같은 강의입니다. 자신이 처한 절실한 문제들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의 강의였을까요? 이 구절에서 현실에 대한 시인님의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詩)가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시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여기서 시인님은 '나는 다만' 하고 쉼표를 찍은 뒤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홀로'에 방점이 찍혀있네요. 함께 연대하지 못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습니다.
소중한 동무들과 멀어져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나는 무얼 하고 있는가? 무얼 바라고 이러는 걸까? 어쩌자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시는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 어려운 삶의 실상을 제대로 시에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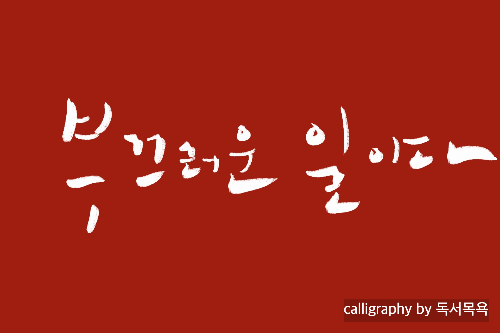
3.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윤동주 시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이 구절에서 두 자아가 등장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는 현실적 '나'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고 다독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상적 '나'입니다.
지금 세상/현실은 새까만 밤입니다. 이상적 '나'는 이 마지막 연에서 지금까지 번민의 늪에 빠져있던 현실적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극적으로 '시대처럼 올 아침'을 맞는 '나'로 건너갑니다. 이 과정에서 두 자아는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합니다.
왜 '눈물과 위안'을 악수를 한다고 할까요?
'시대처럼 올 아침'. 시인님은 시 '참회록'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시대처럼 올 아침'이네요. 그런 날을 위해 시인님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닦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약한 나여, 이제 안녕. 이제는 전혀 새로운 나로 재탄생한다는 다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모종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눈물로 과거의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앞으로 고난의 가시밭길이 분명할 그런 길을 가게 될 이후의 '나'에게 위안을 건네는 악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손', 미안한 손일 수밖에요.
그 결연한 '최초의 악수'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인님의 그 '최초의 악수' 1년 1개월 후인 1943년 7월 14일 독립운동이라는 죄명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문받다 운명했습니다.
글 읽고 마음 목욕하는 블로그 '독서목욕'에서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더 만나 보세요.
윤동주 시 또 다른 고향
윤동주 시인님의 시 '또 다른 고향'을 만납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는 시입니다. 함께 읽으며 마음을 맑히는 '독서목욕'을 하십시다. 1. 윤동주 시 '또 다른
interestingtopicofconversation.tistory.com
'읽고 쓰고 스미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선도 오공법 관세 (115) | 2024.02.07 |
|---|---|
| 목소리 코칭 - 공명 목소리 (122) | 2024.02.06 |
| 황동규 시 삼남에 내리는 눈 (114) | 2024.02.04 |
| 이종용 노래 겨울아이 (109) | 2024.02.03 |
| 박진규 시 통도사 홍매 (128) | 2024.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