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시인님의 시 '뜨락'을 만납니다. 저마다의 '삶의 뜨락'을 성찰하게 하는 시입니다. 함께 읽으며 마음을 맑히는 독서목욕을 하십시다.
1. 김상옥 시 '뜨락' 읽기
뜨락
김상옥(1920~2004년, 경남 통영)
자고 나면
이마에 주름살,
자고 나면
뜨락에 흰 라일락.
오지랖이 환해
다들 넓은 오지랖
어쩌자고 환한가?
눈이 부셔
눈을 못 뜨겠네.
구석진 나무 그늘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 ···
이날 이적지
빛을 등진 채
빌붙고 살아 부끄럽네.
자고 나면
몰라볼 생시,
자고 나면
휘드린 흰 라일락
▷「김상옥 시선」(김상옥 지음, 최종환 엮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년) 중에서
2. 60세에 이르러 삶을 돌아보며 쓴 시
시 '뜨락'은 1980년에 나온 시인님의 시집 「묵(墨)을 갈다가」에 실려있습니다.
이 시집의 첫 번째 시가 표제시 '묵(墨)을 갈다가'이고, 두 번째 시가 '뜨락'입니다.
이는 그만큼 시 '뜨락'이 마음 깊이 두는 시라는 시인님의 눈짓이겠네요.
시인님 60세 즈음의 시입니다.
논어에서 '이순(耳順)'이라고 칭하는 60세,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서 어떤 일을 들으면 바르게 이해된다는 나이에 시인님은 어떤 생각에 젖어 있었을까요?
'자고 나면 / 이마에 주름살 / 자고 나면 뜨락에 흰 라일락'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까요?
이즈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겠지요?
시인님에게 그것이 '이마에 주름살'이었네요.
울적한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뜨락에 흰 라일락'이 피었네요.
밤새 환하게요.
쪼글쪼글한 주름살과 환하게 피어난 라일락!
이렇게 나와 라일락은 너무나 확연히 대비되네요.
환한 라일락 속이라서 나의 서글픔이 더 환하게 드러나네요.
이런 순간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던지요.
'오지랖이 환해 / 다들 넓은 오지랖 / 어쩌자고 환한가?'
'오지랖'은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합니다.
하얗게 피어난 라일락으로 옷의 앞자락이 환해졌다고 하네요.
라일락이 내뿜는 찬란한 빛에 반사되어 환해진 앞자락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듯하네요.
두 번째 행의 '넓은 오지랖'은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고, 또 염치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시인님은 자신의 오지랖(앞자락)이 환해진 것을 보고 오지랖 넓은 이들이 떠올랐겠습니다.
두 오지랖이 겹쳐지면서 시인님은 이렇게 탄식하네요.
'어쩌자고 환한가?'
오지랖 넓은 이들이 부끄럼도 없이 오히려 환하게만 살아가는 세태를 떠올렸을까요?
'눈이 부셔 / 눈을 못 뜨겠네 / 구석진 나무 그늘 /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 ···'
'눈이 부셔 눈을 못 뜨겠네'. 이 구절을 읽는 우리에게 두 가지 풍경이 겹칩니다.
하나는 라일락이 환하게 피어나 눈이 부신 집안의 뜨락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지랖 넓은 이들이 질주하는, 눈을 못 뜰 정도로 어지러운 집 밖 세상의 뜨락입니다.
그렇게 눈이 부신데 '구석진 나무 그늘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가 눈에 들어왔네요.
'작은 벌레 ···'에서 말줄임표(···)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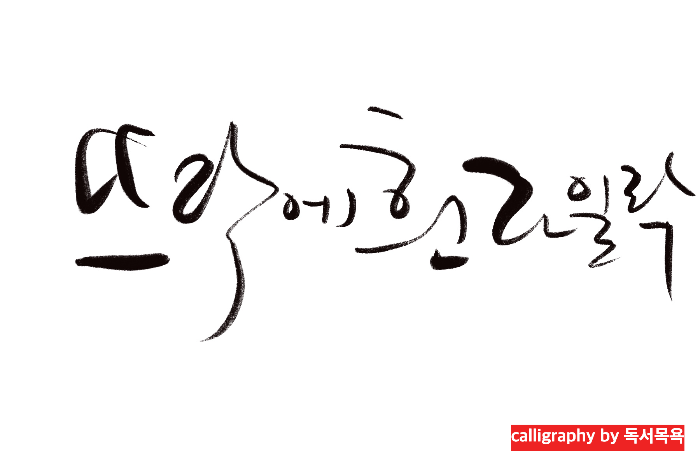
3. 덧없는 삶, 어찌 부끄러운 삶이어야겠는가?
아, 시인님은 '구석진 나무 그늘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를 보고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네요.
'이날 이적지 / 빛을 등진 채 / 빌붙고 살아 부끄럽네'
'이적지'는 시인님이 고향 말(경남 통영)입니다. 뜻은 '이제껏'.
'구석진 나무 그늘'에서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가 자신인 것만 같았다고 하네요.
'이적지 빛을 등진 채' 살아온 자신 같다고요.
이를 어찌할까요?
'구석진 나무 그늘'에서 '꾸물거리는 작은 벌레'처럼 자신도 음지에서 '빌붙고' 살았다고 합니다.
'빌붙다'라는 말은 남에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요.
이 구절을 읽는 우리도 저마다의 삶이 양지에서의 주체적인 삶보다 음지에서의 수동적인 삶은 아닌지 성찰하게 되네요.
시인님은 그렇게 '빌붙고 살아 부끄럽네'라고 합니다.
시인님의 삶이 온통 그러했겠습니까만, 60세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이토록 절실히 성찰하는 시인님의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만히 건너오네요.
'자고 나면 몰라볼 생시 / 자고 나면 휘드린 흰 라일락'
여기서 '생시(生時)'는 살아 있는 동안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고 나면 몰라볼 생시', 자고 나면 우리 저 세상 사람일지 모른다고 하네요.
'자고 나면 휘드린 흰 라일락'. 자고 나면 그래도 라일락은 휘드러지게 피어 있을 거라고 하고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생사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라일락은 휘드러질 거라고요.
우리네 삶은 이리 무상한 것이네요. 헛되고 허전한 것이네요.
그러니 어찌 부끄러운 삶이어야겠는지요?라고 시인님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글 읽고 마음 목욕하는 블로그 '독서목욕'에서 김상옥 시인님의 시조를 만나 보세요.
김상옥 시조 사향
김상옥 시인님의 시조 '사향(思鄕)'을 만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조, 저마다의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시조입니다. 함께 읽으며 마음을 맑히는 독서목욕을 하십시다.
interestingtopicofconversation.tistory.com
'읽고 쓰고 스미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선도 통증 샤워 (96) | 2024.04.10 |
|---|---|
| 소문만복래 뜻 웃음 효과 웃는 법 (91) | 2024.04.09 |
| 8 체질론 체질과 건강 (107) | 2024.04.07 |
| 윤석중 동시 종달새의 하루 (89) | 2024.04.06 |
| 조병화 시 봄 (88) | 2024.04.05 |



